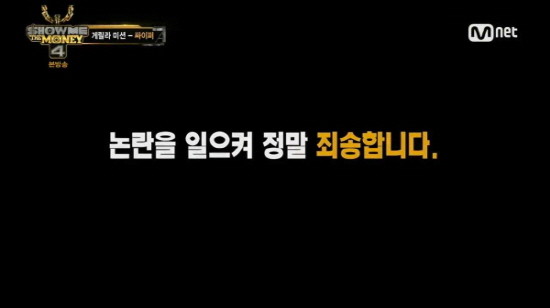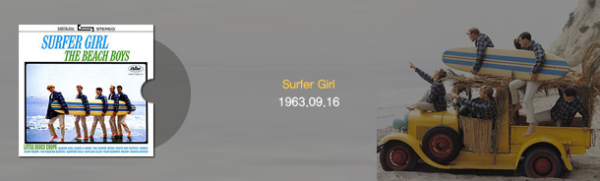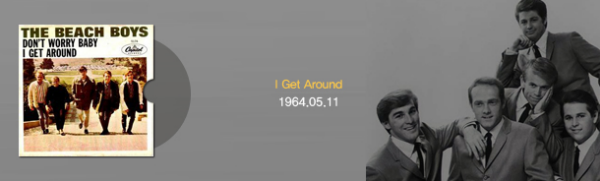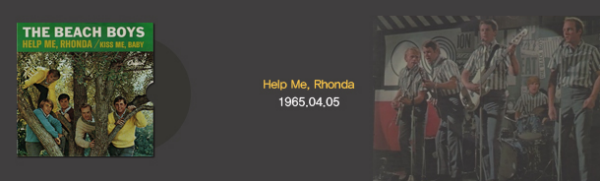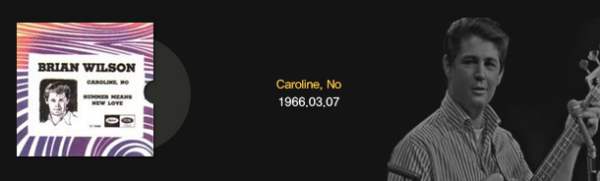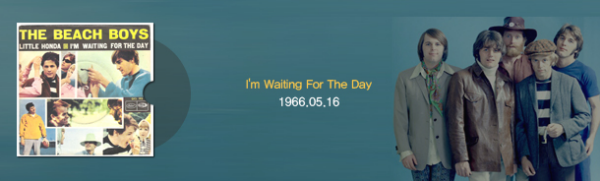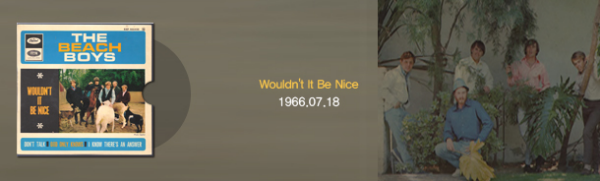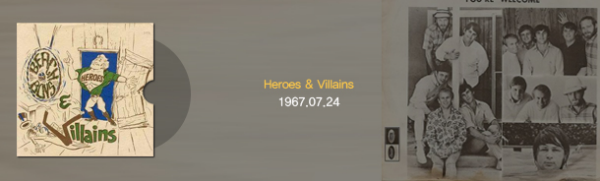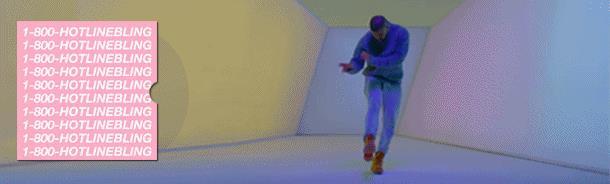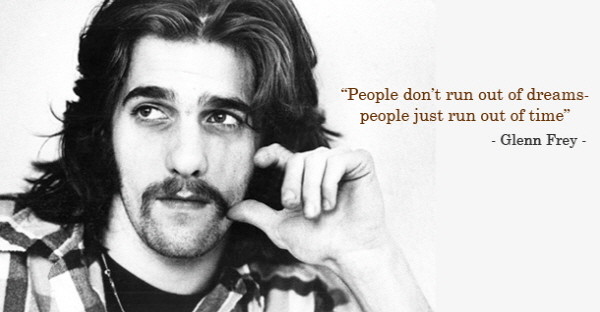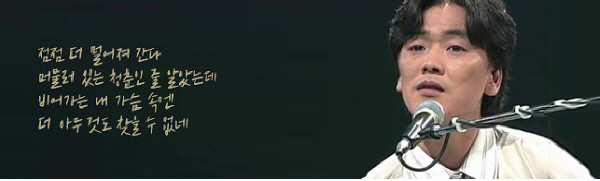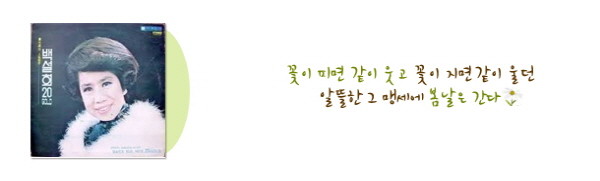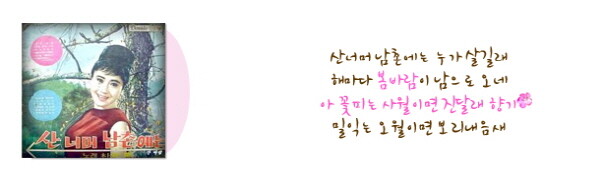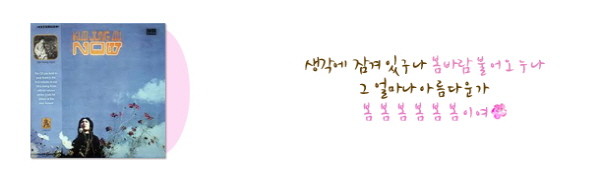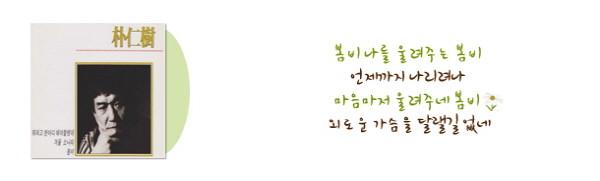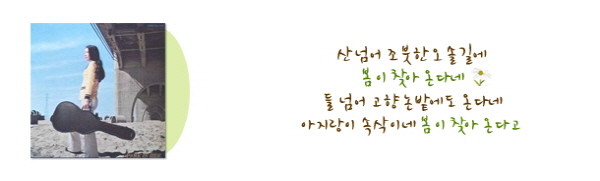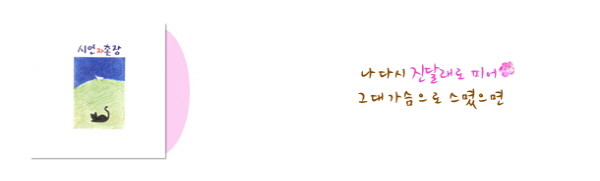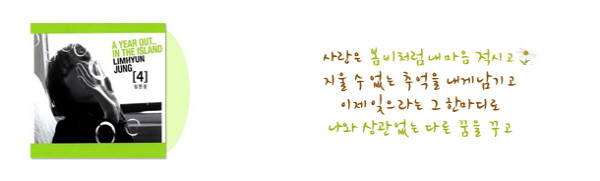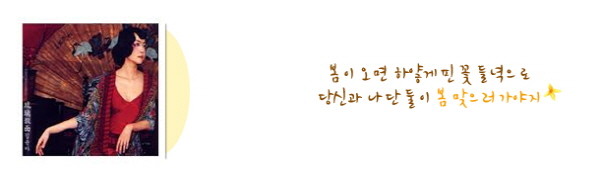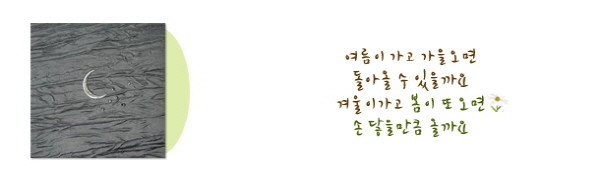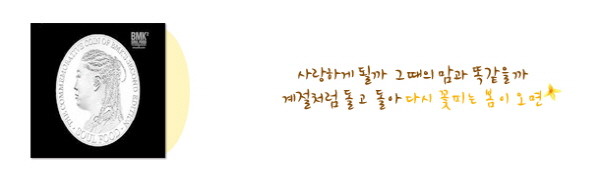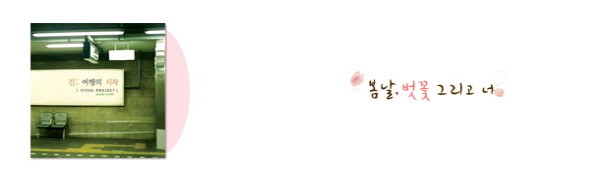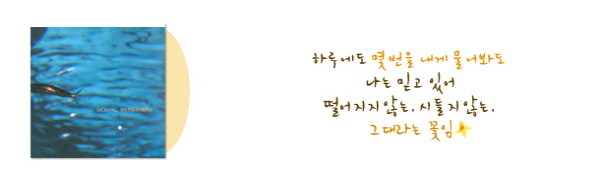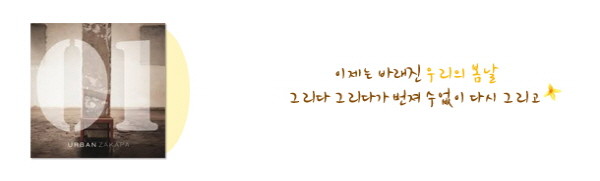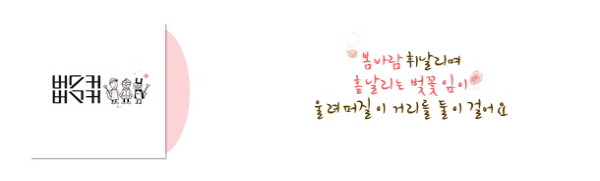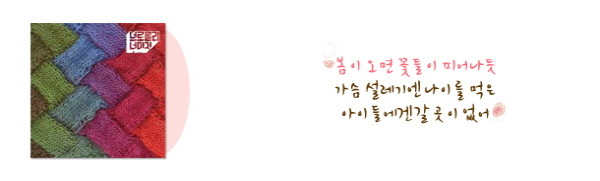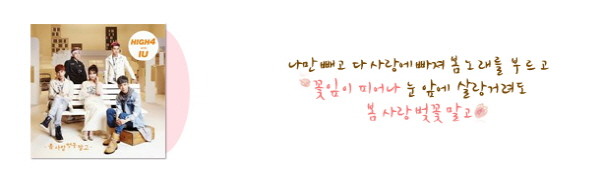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미국은 물론 세계 전 지역에서 소식을 맞아들이며 6월의 퀴어문화축제들에 열기를 더했고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일 제16회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됐다. 사회 각 영역에서 성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한 큰 목소리가 다시금 뚫고 나오는 요즘이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이들의 권리 옹호와 응원이 높아지는 음악계에도 이번 결정은 더욱 뜻깊다.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많은 곡 가운데, 이번 동성 결혼 합법화 판정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할 아티스트들의 열여섯 작품을 선정했다.

Lady GaGa - Born this way
2012년 레이디 가가의 첫 내한 공연 당시, 한 종교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이들은 '레이디 가가가 동성애자이고 동성애옹호론자여서 동성애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연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분명 이는 사실무근은 아니다. 「Born this way」에서 그녀는 자신의 소신을 강력하게 공표한다.
'Cause baby you were born this way / No matter gay, straight, or bi,
/ Lesbian, transgendered life / I'm on the right track baby'
(왜냐면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게이이든, 이성애자든, 양성애자든, 레즈비언이든, 트랜스젠더이든,
잘 걸어가고 옳은 길로 가고 있다구)
그녀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명료하다. '신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가 될 필요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자'는 것이다. 동명인 앨범< Born This Way >에는 양성애자라 왕따를 당하고 결국 자살한 소년 '제이미 로드마이어'를 추모한 「Hair」가 함께 수록되어 그녀의 신념에 쐐기를 박는다.
'난 그냥 나이고 싶어, 그리고 난 네가 진정한 내 모습을 사랑해주었으면 해' 라고(「Hair」 중에서)
2015/07 김반야(10_ban@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wV1FrqwZyKw

Ke$ha - We r who we r
오랫동안 동성애자와 동성애 혐오주의자 간에 갈등을 겪어온 미국은 2010년, 동성애자 청소년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과 자살이라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직면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성애 청소년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케샤는 이들을 위한 노래를 제작했다. 묵직한 비트와 강렬한 전자음에 오토튠을 점철시켰고 '우리는 모두 슈퍼스타,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라는 메시지로 동성애자들을 독려했다. 「We r who we r」는 강한 중독성과 성 소수자들의 전폭 지지로 발매 직후 차트 1위를 차지했고, 40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그의 솔로 곡 중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싱글이라는 영예까지 얻었다.
2015/07 정민재(minjaej92@gmail.com)
https://www.youtube.com/watch?v=mXvmSaE0JXA
Adam Lambert - Whataya want from me
< American Idol > 여덟 번째 시즌의 준우승자인 아담 램버트(Adam Lambert)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 이력만큼이나 성 소수자라는 특이사항도 두드러지는 뮤지션이다. 스스로가 게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의 평등이나 인권문제에 있어 항상 발 벗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에게 본격적인 성공가도를 열어준 싱글 「Whataya want from me」의 경우 아담 램버트 본인의 성 정체성을 암시하는 듯한 뮤직비디오로 화제가 되었다. 아담 램버트를 단독으로 잡는 카메라 샷이 상대와 직접 대화하는 연인의 시선처럼 느껴져 그의 성 정체성을 묘하게 연상시키는 연출을 보여준다.
2015/07 이기선(tomatoapple@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GsQBZFWJT6s
Frank Ocean - Bad religion
프랭크 오션이 여러 방면으로 훌륭하기에 대단한 작사가라는 것을 대부분 간과한다. 「Bad religion」은 그 절정 중 하나다. 교회 혹은 성당을 떠오르게 하는 오르간 반주, 그는 택시기사에게 정신 상담을 부탁한다. 이어지는 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가 게이인 것을 아는 이들은 「Bad religion」에 동성애가 죄악시되는 종교를 대입하여 감상할 수 있고, 마지막 흐느낌에 집중한다면 성립할 수 없는 짝사랑 상대를 대입하여 음미할 수도 있다. 절망적인 노래다. 여기에 가슴 아리는 프레이징과 적재적소의 팔세토 코러스가 작용하여 완벽한 PBR&B 넘버를 만들었다.
2015/07 전민석(lego93@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xzvxsiIpep8
Sara Bareilles - Brave
'긍정의 힘'을 노래한 사라 바렐리스의 「Brave」는 친구의 커밍아웃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는 동성애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개념을 확장하여 서로 다른 모든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용감히 세상 앞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 당신의 용감함을 보고 싶다'는 응원의 메시지는 경쾌한 피아노 터치와 힘 있는 목소리로 기분 좋은 공감을 부른다. 사라 바렐리스는 이 곡을 통해 사회의식을 갖춘 성숙한 싱어송라이터로서 대중에게 이름을 깊이 남겼을 뿐만 아니라 빌보드 싱글차트 23위의 상업적 성공까지 맛보았다. 성 소수자 매거진 < 더 아드보카트 (The Advocate) >조차도 이 곡에 대해 '현세대 LGBT들을 위한 송가로 운명 되었다'며 극찬했다.
2015/07 김도헌(zener1218@gmail.com)
https://www.youtube.com/watch?v=yNd_YXJXZOA

Macklemore & Ryan Lewis - Same love
이 주제에 연상되는 대표적인 노래 중 하나다. 2014 그래미 어워즈에서 공연될 때, 동성애 커플을 포함한 33쌍의 '실제' 결혼식 퍼포먼스 또한 언급되어있으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가사, 진취적인 장면으로 이러한 글들에 클리셰처럼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뻔해지겠으나 그동안 없었던 것은 힙합의 성격 때문이다. 힙합은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남성성이 극대화된 장르인 만큼 남을 조롱하는 가사에 Faggot 혹은 Gay가 쓰였다.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는 래퍼들도 단순한 비하의 수단으로 사용할 만큼 뿌리박혀있었다. 맥클모어가 설득했고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그러한 태도가 줄어들었다.
'Our culture founded from oppression
Yet we don't have acceptance for 'em'
2015/07 전민석(lego93@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yVb9mG_Gf4Y

Arcade Fire - We Exist
한 남자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민다. 이윽고 브래지어를 차고, 금발의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한 그는 이제 더는 '그'가 아닌 '그녀'다. 여성이 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술집에서의 희롱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폭행이다. 절망의 절정에서 그가 빚어내는 춤사위는 애처롭고도 고통스러운 자아 탐구의 과정이다. 트랜스젠더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절절한 고백과 앤드류 가필드의 열연을 담은 뮤직비디오로 「We exist」는 2014년의 거대한 울림이 되었다.
2015/07 김도헌(zener1218@gmail.com)
https://www.youtube.com/watch?v=hRXc_-c_9Xc

Sam Smith - Lay me down
영국출신 뮤지션 샘 스미스(Sam Smith)는 앨범< In The Lonely Hour >발표 이전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었고, 실제로 앨범은 발매 이후 그래미 시상식 여러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는 등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특이한 것은 음반 발매 당시 샘 스미스의 발언이었는데 대중에게 스스로 성 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한 것이 그것이었다.
「Lay me down」이 그런 그의 성향을 잘 드러내 주는 곡으로 꼽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올해 공개된 뮤직비디오 때문이다. 샘 스미스는 동성결혼식을 올리는 커플으로 직접 분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다. 동성애자 이성애자 트렌스젠더 그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어디서나 합법적으로 연을 맺을 수 있길 바라는 그의 소망이 적어도 미국 땅에서는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2015/07 이기선(tomatoapple@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HaMq2nn5ac0

Hozier - Take me to church
'너희는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마라. 그것은 문란한 죄이다.' (레위기 18:22)
기독교의 잣대, 성경 안에선 동성행위를 '번식을 목적으로 한 성행위'가 아닌 '쾌락만을 위한 성행위'로 보며 수간, 근친상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큰 죄악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기독교는 동성애적 성향을 선천적인 본성이 아닌 질병으로 치부하며, 치료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일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호지어(Hozier)의 「Take me to church」는 이러한 기독교가 대표하는,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집단에 대한 비난적인 태도를 가진 곡이다. 가사엔 개인의 특수한 사랑을 위해 개인의 신념조차 포기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관해 서술되어 있다. 이는 마치 폭력집단처럼 묘사되어있는 반 동성애 집단들이 게이 커플이 숨겨놓은 나무상자(성 정체성)를 제거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다.
2015/07 이택용(naiveplanted@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PVjiKRfKpPI

Queen - You are my best friend
명반< A Night At The Opera >의 분위기를 주조하는 「You are my best friend」는 베이스 주자 존 디콘이 부인이게 바치는 송가였지만 'Friend'의 의미는 대중에게 다르게 해석되었다.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지만 최고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부를 때 팬들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남다르다. LGBT 뮤지션의 상징이었던 그는 1991년 재능을 시기한 신에 부름에 하늘로 돌아갔지만, 무수히 많은 이들의 심장에 아직 최고의 '싱어'이자 '퍼포머', 나아가 록의 세계로 손을 잡아 이끈 진짜 '친구'로 영원히 남아있다.
2015/07 이기찬(geechanlee@gmail.com)
https://www.youtube.com/watch?v=pknlFm-gxLc
Elton John - We all fall in love sometimes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 중 하나이자 숱한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엘튼 존의 감성적인 넘버.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 속에서 울려 퍼지는 엘튼 존의 목소리는 가히 매력적이다. 엘튼 존 특유의 수려한 멜로디 메이킹과 탁월한 가창력은 항상 청자를 어루만진다. 약 50년간을 함께 해온 그의 음악적 동반자인 작사가, 버니 토핀(Bernie Taupin)의 노랫말 또한 사랑의 아련함을 여실히 표현해낸다.
2015/07 윤석민(mikaelopeth@hotmail.com)
https://www.youtube.com/watch?v=YQBWYfsCeC4
ABBA - Knowing me, knowing you
아바는 모든 이에게 인기 있지만, 특히 동성애자들에게 사랑받는 뮤지션이다. 게이 커뮤니티에서는 디스코를 즐겨듣는 문화가 있었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아바의 댄스곡은 더욱 활발히 공유되었다. 덕분에 「Dancing queen」은 지금까지 퀴어 축제의 플래쉬몹 곡으로 사용되며, 반짝이 무대 의상과 퍼포먼스까지 관심을 받았다.
육아와 일에 대한 다툼으로, 아바의 두 부부가 이혼한 사연은 게이 집단 사이에서 화제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노래 속 가사가 당시 멤버들의 지친 마음을 담고 있다. 노래를 발매한 뒤 네 사람 모두 파경에 이르렀지만, LGBT 사이에서는 서로를 알아가자는 이해의 메시지로 활용된다.
2015/07 정유나(enter_cruise@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x25WSOn6MSQ
Erasure - A little respect
약간의 존중. 갖기에는 실로 어려운 것이지마는 이 약간의 존중은 문제의 해결로 닿는 가장 빠른 길을 제공한다. 이레이저의 「A Little resspect」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내게 팔을 열어주길 청하는 노래의 가사를 좁게는 구애의 한 마디로, 넓게는 존중을 바라는 부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디페시 모드와 야주, 어셈블리를 거쳐 온 빈스 클라크와 보컬리스트 앤디 벨이 결성한 이레이저는 깊이 있는 텍스트와 근사한 신스 팝 사운드를 섞어 1988년에 이 곡을 내보였다. 가릴 것 없이 너른 사랑을 받은 「A little respect」는 그해 영국 싱글 차트 4위, 미국 빌보드 차트 14위라는 성적을 획득했다. 멤버 앤디 벨은 일찍이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혀 성소수자 사회에서의 팝 아이콘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2015/07 이수호(howard19@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x34icYC8zA0

Madonna - Vogue
패션잡지 < Vogue >에서 이름을 딴 댄스 '보깅'은 1980년대 뉴욕의 게이 클럽에서 유행하던 춤의 종류였다. 마돈나는 패션모델들이 포즈를 취하듯 우아하고 관능적인 선의 미학을 강조한 보깅에 강하게 매료되었다. 영화< Dick Tracy >의 삽입곡으로 사용된 「Vogue」는 디스코의 영향을 받은 세련된 하우스 댄스 넘버로, 제목부터 안무, 가사(“Strike a pose”)까지 보깅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었다.
데이비드 핀쳐 감독이 제작한 뮤직비디오는 보깅을 추는 마돈나와 댄서들을 감각적인 흑백 필름에 담아 노래의 인기에 힘을 보탰고, 곧이어 전 세계 각국의 차트 1위를 수성하며 음지의 게이 문화였던 보깅을 메인스트림으로 진출시켰다. 이 후 보깅은 세계 댄스의 한 갈래로 가치를 인정받았고, 국내에서도 최근 신화가 「This love」의 안무로 활용하는 등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동성애자들의 컨텐츠 중 하나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희망적 가사와 섬세한 사운드의 이 곡이 게이들의 앤썸(anthem)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2015/07 정민재(minjaej92@gmail.com)
https://www.youtube.com/watch?v=GuJQSAiODqI

Ryuichi Sakamoto & David Sylvian - Forbidden Colours
'Here am I, a lifetime away from you / The blood of Christ, or the beat of my heart
My love wears forbidden colours. / My life believes in You once again'
(내가 있는 곳, 당신과 떨어진 삶 / 그리스도의 선혈, 혹은 심장의 울림
나의 사랑은 금지된 색채를 입었다네 / 나의 삶은 또 한 번 당신을 믿는다네)
제목은 낯설지 모르지만 멜로디는 분명히 친숙할 것이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대표곡 「Merry Christmas, Mr. Lawrence」을 샘플링했고 재팬(Japan)의 보컬 데이비드 실비안(David Sylvian)이 보컬을 맡았다. 「Merry Christmas, Mr. Lawrence」는 데이비드 보위가 주연한<전장의 크리스마스>의 주제곡이며, 영화 내용 자체가 동성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 '금지된 색체'라는 비유로 자신의 사랑을 고뇌하는 노래는 아찔할 정도로 탐미적이다. 아름답고 몽환적인 데이비드 실비안의 목소리는 연기처럼 흩날리며 긴 여운을 남긴다.
2015/07 김반야(10_ban@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x1YkHJJi-tc

Christina Aguilera - Beautiful
'I'm beautiful / No matter what you say'
타자(他者)로 규정된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이다. '일반'으로 불리지 못하는 존재들을 향해 음악가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는 뮤직비디오를 통해 동성애자, 드랙 퀸, 거식증 환자 등 사회에서 쉽게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지지를 직접 드러내었다. 거울을 깨는 행위는 자기파괴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시든 채로 아래쪽을 향하고 있던 해바라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고개를 드는 장면에서 고음역의 애드리브가 더해지면서 절정을 이룩하고 해방을 선사한다. 2002년에 발표된 < Stripped >의 수록곡인 이 곡은 그해의 빌보드 핫 100에서 16위를 차지했으며,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대표곡이자 LGBT 커뮤니티의 송가로 사랑받고 있다.
2015/07 홍은솔 (kyrie1750@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USUDzycRvM
[관련 기사]
- 지하에서 우주로, 비틀즈 〈Across the universe〉
- 사랑에 빠지고 싶을 때
- 드레스덴 축제의 매혹적인 단조
- 래칫 뮤직(Ratchet music)
- 데이비드 레터맨 쇼 베스트 라이브 12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