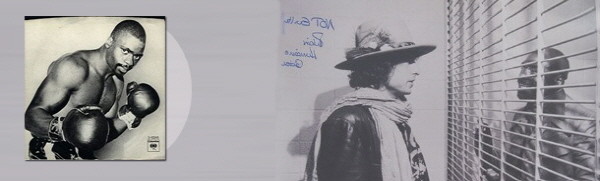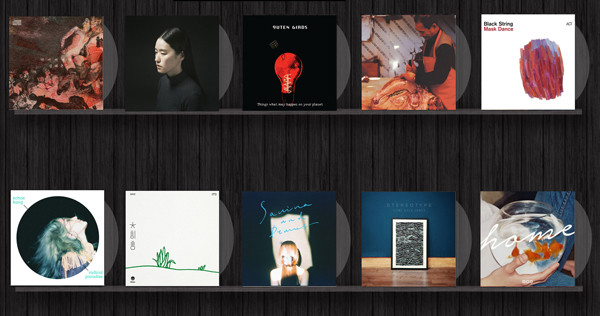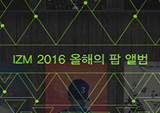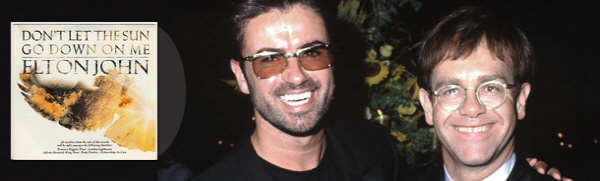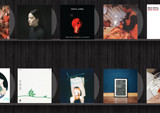![1.jpg]()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밥 딜런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쏟아지고 있다. 노랫말이 문학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지만, 그가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959년 이래로 밥 딜런이 써 내려간 문장들은 음악과 시대를 바꾸었다. 그는 음표에 사상과 철학을 부여한 최초의 인물이다.
사실 밥 딜런의 가사는 중의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 많다. 괴팍하기로 소문난 그는 인터뷰에서도 모호하게 답해 사람들을 더욱 헷갈리게 만든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 오역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노래와 기록들을 뒤져, 심드렁하고 무뚝뚝한 사내의 자취를 따라 가보려고 한다. 그의 뒤를 좇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그가 남긴 발자국이 록이 걸어온 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록의 궤적이 된 25곡을 소개한다.
![2.jpg]()
Blowin' in the wind (1963)
밥 딜런의 시작이자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품은 새로운 가치의 선언적 울림! 미국 민주주의 토대인 자유, 평등, 평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밥 딜런의 모던 포크 출반선인 이 곡이 대변했다. 그게 반전(anti-war)과 인권(civil rights) 운동과 맞물리면서 밥 딜런은 단숨에 세대의식과 시대정신의 총아로 솟아올랐다. 지구촌 곳곳에 청년문화와 저항(protest)의 기수들이 속출했다.
브라질에는 카에타노 벨루주와 질베르토 질이, 쿠바에는 실비오 로드리게즈가, 세네갈에는 이스마엘 로가 출현했다. 빅토르 하라는 칠레의 딜런, 도노반은 영국의 딜런, 김민기는 한국의 딜런이었고 1990년대에 벡(Beck)은 최신판 딜런으로 분했다. 1999년 <디테일> 잡지의 표현에 따르면 '거대한 짐머만(딜런 본명)의 글로벌 저항 빌리지' 구축!
그들은 노랫말로 전에 한 번도 접하지 못해본 언어들이 경이롭게 전개, 배치된 것에 일제히 넋을 잃었고 “대중음악의 노랫말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집단 영감 세례를 받았다. 사랑과 이별이 전부이던 대중가요는 이후로 사회적, 사색적, 성찰적, 철학적 메시지로 심화를 거듭했다. 시대를 갈랐던 1970년대 초반 '영 포크', '청통맥' 등 '메이드 인 코리아 청년문화'의 출발 총성도 이곡이었다. (임진모)
![3.jpg]()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1963)
1962년 녹음해서 이듬해 <The Freewheelin' Bob Dylan>에 실어 발표한 밥 딜런 초기 명곡 중 하나. 그 해, 피터 폴 앤 메리(Peter, Paul and Mary) 커버 버전이 빌보드 싱글 차트 9위까지 올라 초기 유명세를 다지는데 이바지했고, 우리나라에서는 포크가수 양병집이 창의적인 가사의 '역(逆)'으로 개사한 버전을 다시 김광석이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로 제목만 바꿔 발표해 인기를 끌었다.
음악의 역사와 그 선상의 진화 과정이 잘 드러난다. 미국 전통 민요 「Who's gonna buy you chickens when i'm gone」의 멜로디를 포크 가수 폴 클레이튼(Paul Clayton)이 1960년 차용했고, 그 선율과 가사 일부가 밥 딜런에게 옮겨가 영감이 되었다. 딜런 자신이 핑거스타일로 주조해낸 찬찬히 흘러가는 기타 리듬 또한 하나의 고전으로 남아 수많은 리메이크 버전을 탄생시켰다.'괜찮으니, 두 번씩이나 고민하지마'라는 가사로 1960년 그 시절뿐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도 숨고를 시간을 부여하는 아름다운 곡. (이기찬)
![4.jpg]()
The times they are a-changin' (1964)
1960년대에 들어서며 미국의 청년들은 변화를 꿈꿨다. 희망과 달리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흑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계속됐고 베트남 전쟁의 공포는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설상가상, 패기에 찬 젊은 리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됐다. 답답한 실상을 견디다 못해 여기저기서 자유와 평등, 평화를 향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격동의 한가운데에 이 노래가 있었다.
'지금 정상에 선 자들은 훗날 끝자락이 되리라. 시대는 변하고 있으므로.'
노래 제목 중 '변화(changin')'에 고전적 강조법인 'a-'를 붙인 것만으로도 이 곡이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다. 딜런은 간단명료한 구절들로 명징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대곡(大曲)을 원했다. 창작 의도는 시대 상황과 적확히 들어맞았다. 그는 시종 매서운 어조로 '바뀌어야 함'을 역설한다. 사람들, 작가와 비평가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세상 모든 부모들, 지금 정상에 선 자들이 모두 경고의 대상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 발맞추지 않는다면 이내 가라앉고 패자가 될 것임을 일갈한다.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낸 노래는 당대 쇄신의 찬가(anthem)가 되었다. 노래는 「Blowin' in the wind」 등과 함께 전 세계 대중음악의 가사 풍토를 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다른 명곡들처럼 이 노래 역시 수많은 후배 가수들에 의해 재해석 되었다. 피터, 폴 앤 매리(Peter, Paul and Mary), 사이먼 앤 가펑클, 비치 보이스, 셰어(Cher) 등 그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기 벅찰 정도다. 여전히 대표적인 저항 송가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노래는 변화하는 시대에 가속 페달을 가한 역사적 유산이다. (정민재)
![5.jpg]()
Subterranean homesick blues (1965)
초기 포크(Folk) 진영에 자리 잡고 있던 딜런은 비틀스(Beatles)의 로큰롤 스타일에 영향을 받아 크나큰 스타일의 변혁을 가한다. 기존 포크송에 강렬한 일렉트로닉 기타 사운드를 가미한 싱글 곡 「Subterranean homesick blues」은 포크 록의 시작을 알렸다. 〈Bringing It All Back Home〉의 대표곡으로써 빌보드 차트 39위에 오르며 그에게 첫 대중적 히트를 안겨주었다.
노래는 여러 아티스트의 창작물로부터 영감을 받아 구성되었다. 우디 거스리(Woody Guthrie)와 피트 시거(Pete Seeger)의 「Taking it easy」 가사 일부분을 인용하고, 척 베리(Chuck Berry)의 「Too much monkey business」 멜로디와 스타일을 참조했으며, 소설 『The Subterraneans』에서 제목을 따왔다. 계급 갈등에 대한 은유와 사회 풍자, 희화화로 가득 채운 노랫말은 당시의 부조리를 공개 석상 위로 올린다.
투어 다큐멘터리 <Don't Look Back>의 오프닝 영상으로 쓰인 이 싱글의 뮤직비디오는 딜런이 직접 단어 카드를 넘기면서 키워드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화제가 되어 많은 패러디를 생성시키기도 하였다. 의도적으로 틀리게 적은 스펠링과 의미에 따라 다르게 꾸민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가사의 위트를 더욱 맛깔나게 덧칠한다. (현민형)
![6.jpg]()
Like a rolling stone (1965)
'Rolling Stone'은 밴드명이나 잡지를 떠나 록의 가장 큰 상징물이다. 이 노래 덕분에 1965년은 밥 딜런에게 가장 큰 변화기이자 전성기가 펼쳐진다. 그의 앨범 중 최고로 꼽히는<Highway 61 Revisited>에 수록되어 발매 당시에도 큰 사랑을 받았다.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2위, 영국 차트 4위에 올라 밥 딜런의 노래 중 가장 대중적이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곡이다.
이 노래는 결코 달콤한 러브송이 아니다. 오히려 어둡고 냉소적이다. 사실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가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명문학교를 나와 상류층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여인의 추락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때 세상을 발밑에 둔 것 같았던 여인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다. 뼈아픈 교훈이지만 손에 쥔 것이 없을때 온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깨달음도 내포되어 있다.
다른 노래들과 마찬가지로 특정인을 겨냥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가장 물망에 오른 것은 앤디 워홀(Andy Warhol)과 그의 뮤즈였던 에디 세즈윅(Edie Sedgwig)이다. 혹자는 진보가 패스트 패션처럼 가벼워져 버린 미국 사회를 저격했다는 설도 제기했다. 하지만 밥 딜런은 “내 노래 속에 등장하는 그(he)와 그것(it), 그리고 그들(they)은 대부분 나를 얘기한 거다”라며 화살을 본인에게 돌린다.
전설은 해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Like a rolling stone」은 <롤링스톤>지가 선정한 팝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1위(2010), <피치포크>에서 1960년대 최고의 노래 4위(2006)에 선정되면서 여전히 후대에도 회자되고 있다. 노래 자체의 멜로디나 구성이 매력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명곡으로 추앙되기 힘들다. 새로운 장르의 시발점. 그러니까 포크가 아닌 록의 편성으로 만들어져, 한 장르의 포문을 열었기에 이토록 뜨거운 환대를 계속 받고 있다.
당시에는 포크 히어로였던 그가 통기타가 아닌 일렉트로닉 기타를 쥐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 곡이 뜨기 직전인 1965년 5월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그가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관객들에게 계란과 '유다'라는 야유 세례를 받는다. 포크 팬들에게 전기를 사용하는 기타는 '물질주의'와 '배신'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공연은 흥분과 박수가 아니라 증오와 질책으로 가득했다. 음악평론가 데이브 마시(Dave Marsh)는 “이것은 공연이 아니었다. 이건 전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도전과 반목을 겪은 후, 공연은 록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순간으로 기록된다.
이후 평론가들은 포크와 록을 뒤섞은 새로운 노래에 '포크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포크록'은 프랭크 자파 등 동시대 뮤지션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폴 매카트니는 “그는 음악이 더 새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Like a rolling stone」의 탄생은 한 장르의 출발일 뿐 아니라, 세상에 없던 소리를 만들어낸 새로운 발명이었다. (김반야)
![7.jpg]()
Ballad of a thin man (1965)
가사에 등장하는 'Mr. 존슨'에 대한 추리는 어렵지 않다. 노래는 계속 주류 문화와 기성세대의 보수성과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때문이다. 가사에 '연필을 들고 있는'이라는 표현이 있고, <아임 낫 데어>에서 이 노래가 나올 때 언론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존슨'은 '언론'을 상징한다는 추측이 많다. 반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설도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하지만 밥 딜런은 “당신은 그를 알고 있지만 그 이름으로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끝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
Mr. 존슨'의 정체는 묘연할지 몰라도 그의 행태와 태도는 분명하다. 연줄이 많고 소득공제가 되는 자선 단체에서 교수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 그들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하지만 딜런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부서질듯 내리치는 건반은 분노를 대신하고 낮게 반복하는 후렴구가 의미심장하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요. 존슨씨?' 노래 안에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 비록 비주류의 독설이지만 노랫말은 뾰족한 송곳이 되어 세상의 'Mr. 존슨'들을 관통한다. (김반야)
![8.jpg]()
Rainy day women #12 & 35 (1966)
<Blonde on Blonde>의 포문을 알리는 곡이자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밥 딜런의 빌보드 차트 최고 히트 싱글(2위). 「Everybody must get stoned」라는 코러스 라인 구절이 노래 중간 웃음을 터뜨리는 자유분방함에 더해 마약을 찬미하는 암시라 논란을 낳았으나, 그는 '절대 약물 노래(Drug song)는 가까이하지 않는다.'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마칭 밴드 혹은 구세군을 연상시키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관악기 세션을 풍성히 초청해 일종의 빅 밴드를 구성했고, 실제로 의도된 혼돈 가운데 녹음되어 초기 포크-사이키델리아 곡이 탄생했다. 마지막으로, 의아함으로 가득한 곡 제목의 의미는 의외로 간단명료하다. 레코딩 도중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들어선 두 여성, 그 모녀의 나이가 어렴풋이 12세, 35세였다는 것. (이기찬)
![9.jpg]()
I want you (1966)
하모니카의 경쾌한 음색, 백 비트, 보헤미안의 솔직한 사랑과 컨트리풍 음악, 패티 스미스 창법의 원류가 된 독특한 싱잉이 만난 작품 「I want you」, 이 곡은 올해 50주년을 맞은 그의 대표작 <Blonde on Blonde>에 수록되어 있다. 평론가 로버트 쉘튼은 이 곡뿐만이 아니라 밥 딜런의 7집 전체가 사라 딜런(셜리 마를린 노츠니스키, 사라 로운즈)과의 '웨딩 앨범'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딜런에게 배우자의 존재는 축복이었다.
그러나 '당신을 원해요'는 시간이 지나 처음의 뜻을 보존할 수 없게 된다. 1966년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문장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이후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며 더 이상 예쁘기만 한 텍스트로 남을 수 없었다. 바쁜 톱스타 남편의 뒤에서 홀로 가정을 돌봐야 했던 사라 딜런에게 결혼 생활은 밥 딜런이 추억하는 것만큼 아름답진 않았다고 한다. 딜런을 다룬 영화 <아임 낫 데어>(그곳에 나는 없다)의 타이틀이 또 한 번 설득력을 얻는 순간이다.
물론 음악가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관점으로도 「I want you」의 가사는 쉽게 웨딩 송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평범하지 않은 단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죄 많은 장의사는 한숨을 쉬고, 외로운 악사는 눈물을 흘리고, 은빛 색소폰은 당신을 거부하라 말한다' 식의 오묘한 문법은 동시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비틀스나 비치 보이스와는 또 다른 형태였다. (홍은솔)
![10.jpg]()
Stuck inside of mobile with the Memphis blues again (1966)
2007년 영화 <아임 낫 데어>의 시작을 알리는, 미들 템포의 리듬 감 넘치는 이 곡을(사실 딴 곡도 다 그랬지만)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솔직한 생각. “아니, 이렇게 절(節)마다 완전 다른 가사를 밥 딜런은 외우기나 할까, 한 번 해놓고 다음엔 까먹는 거 아냐?” 시간이 더 흐르면서 감탄이 하나 더 붙었다. 가사도 가사지만, 그게 아무리 빼어나도 곡조와 맞지 않으면 소용없는 짓! 밥 딜런을 노랫말 술사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곡 메이킹'의 천재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거기 같은 포크'의 범주에 속한 딜런의 앨범이 왜 무더기로 20세기 명반에 꼽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록의 구세주(Rock's messiah)라는 호칭을 얻은 이유가 이거다. 뒷얘기지만 밥 딜런도 곡과 가사를 입에 맞추느라 재 편곡 등 녹음 작업에 무진 애를 썼다고 한다. 올해로 50년 된 역사적 더블 LP <Blonde on Blonde>의 한 곡. 정확한 의미도 몰랐지만 그럼에도 이 곡을 듣는 게 축복임은 젊었을 때, 그때 이미 알았다. (임진모)
![11.jpg]()
Leopard-skin pill-box hat (1966)
포크의 대명사 혹은 대부로 알려진 딜런은 뛰어난 블루스 싱어이자 연주자로도 유명하다. 어릴 적부터 포크와 함께 전통 블루스에 심취한 그는 데뷔작 <Bob Dylan>부터 음반마다 한두 곡의 블루스를 수록해왔다. 그의 어깨에 전기 기타가 메어진 후에 제작된 <Blonde on Blonde>의 수록곡 「Leopard-skin pill-box hat」 또한 전기 기타로 연주한 일렉트릭 블루스이다. 곡은 후에 벡(Beck)과 라파엘 사딕(Raphael Saadiq)에 의해 재탄생되기도 했다.
「Just like a woman」와 마찬가지로 에디 세즈윅(Edie Sedgwick)에게 영감을 받은 곡이다. 노래는 연인에게 퇴짜 맞은 이가 느끼는 불쾌감을 서술하는 동시에, 1960년대 초반 존 F. 케네디의 부인,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가 유행시킨 패션인 '표범 무늬의 모자'를 고급 패션의 상징으로써 사용하여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했던 당시의 세태를 풍자한다. (이택용)
![12.jpg]()
Just like a woman (1966)
여성(woman)이 누구인지 불명확하다. 앤디 워홀(Andy Warhol)의 핀업 걸이자 당시 연인이었던 에디 세즈윅(Edie Sedgwick)이란 소문이 가장 유력하지만, '나는 굶주렸고, 세상은 너의 것이었어'라는 가사 때문에 당시 딜런보다 조금 더 인기 있었던 동료 가수, 존 바에즈(Joan Baez)라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난데없이 마리화나를 뜻하는 속어인 퀸 메리(Queen Mary)가 2절의 첫 부분에 등장한다. 때문에 해석은 또 다른 애매모호함 속으로 접어든다. 안개(Fog)와 암페타민(Amphetamine), 그리고 진주(Pearl)의 특성을 모두 갖춘 'Woman'이 마리화나, 즉 약물을 빗댄 단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혹은 'woman'이 그저 단순한 섹스를 뜻한다는 풀이도 있다. 이는 1절과 중간 마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비(Rain)가 당시 딜런의 성욕이 최고조에 도달했음을 뜻하는 단어라는 추측과 함께 동반되는 해석이다.
애매모호함(Ambiguity). 딜런이 쓴 가사들의 상당수는 난해하고 실험적이다. 그저 들으면 사랑스럽게 혹은 애절하게 느껴지는 「Just like a woman」의 가사는 딜런의 특성을 대표한다. 그는 단어 하나하나에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딜런의 가사가 갖추고 있는 문학적 성질은 이러한 애매모호함뿐이 아니다. 1절의 가사를 살펴보자.
'Nobody feels any ①pain
Tonight as I stand inside the ①rain
Everybody ②knows
That Baby's got new ②clothes
But lately I see her ribbons and her ②bows
Have fallen from her ②curls'
'pain'과 'rain', 'knows'와 'clothes' 등 딜런은 단순한 단어들을 배치하여 시적 압운(Rhyme)을 만들어낸다. 종이에 옮겨지지 않았을 뿐, 한 편의 시와 다를 바 없다. 이 정도면 딜런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반박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택용)
![13.jpg]()
Sad eyed lady of the lowlands (1966)
사람들은 '숨은 인물 찾기'를 좋아한다. 이 노래 역시 'Lady'가 누구인지가 뜨거운 화두였다. 존 바에즈가 리메이크를 했었고, 두 사람의 특수한(?!) 인연, 그리고 그녀의 유독 슬퍼 보이는 눈빛 때문에 존 바에즈가 'Lady'라는 설도 많았다. 하지만 이 노래만은 사라 로운즈(Sara Lowndes)를 위한 곡이라는 증거가 명백하다. 가사를 살펴보면 '그냥 떠나버렸던 너의 잡지사 기자 남편'이란 대목이 있는데 실제로 사라 로운즈의 전 남편은 기자였다. 게다가 제목 자체도 '사라 로운즈'의 스펠링을 변형시켜 만들었다. 결정적으로는 그의 노래 「Sara」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그러고보니 이 노래 제목은 더욱 노골적이다.) '첼시 호텔에 머무는 동안 널 위해 'Sad eyed lady of the lowlands'를 만들었다' 가사나 분위기가 밝은 노래는 아니지만 곳곳에 애절한 마음이 묻어난다. 이상하게도 사랑이란 건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 심란해지는 법이니까.
당시는 라디오가 가장 힘있는 매체였고, 라디오의 특성상 노래가 길게 나가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3분 이하의 밝은 노래가 많았고 실제로 인기도 있었다. 이 노래는 무려 11분 19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만들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그의 고집은 이 '장대한 길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반야)
![14.jpg]()
All along the watchtower (1967)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본 사람이라면 지미 헨드릭스 익스피리언스(Jimi Hendrix Experience) 버전이 더 익숙할 테다. U2, 폴 웰러, 닐 영 등 수많은 아티스트가 리메이크했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곡을 검색하면 지미 헨드릭스 버전이 가장 상위에 노출될 정도니 원작을 넘어선 인기는 실로 대단하다. 둥둥거리는 베이스와 지미 헨드릭스의 연주 스킬로 지루할 틈 없는 곡은 싱글 차트 20위까지 올랐고 딜런조차 헨드릭스 편곡으로 공연할 정도로 완성도 높은 곡이다.
원곡은 굉장히 심플하다. 기타와 하모니카로만 사운드를 꾸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세 개의 코드로 곡이 진행된다. <Blonde on Blonde>,<Highway 61 Revisited>, <Bringing It All Black Home>을 통해 포크록을 탄생시키며 로커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그가 오토바이 사고 이후 종적을 감춘 뒤 발매한 <John Wesley Harding>에서 다시 통기타로 돌아왔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사고 이후 밥 딜런의 공백기에 사이키델릭이 융성하며 환락적이고 쾌락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 딜런은 이에 편승하지 않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며 미국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고 결국 컨트리의 고장 내슈빌에서 앨범을 완성하게 된다. 때문에 음반엔 「All along the watchtower」을 비롯해 「Drifter's escape」, 「I'll be your baby tonight」과 같은 컨트리 넘버들이 가득하다. 노래에서 어쩐지 시골 분위기가 느껴졌다면 제대로 들었다는 증거. 그는 로커빌리의 전설 자니 캐쉬와 「Girl from the north country」를 함께 부르며 확실히 대세와는 다른 노선을 걸었고, 포크록에 이어 컨트리 록의 탄생에 기여한다.
전작보다 사운드의 규모가 작아지고 단순해졌지만 가사의 의미는 너무나도 방대하다. 조커와 도둑의 대화문으로 시작하는 1절, 2절은 3절에서 외부 묘사로 바뀐다. 문학에서 내러티브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딜런의 곡에선 순서가 역전된다. 일차적으로 조커는 상인과 농부가 자기 소유의 무언가를 탐하고 있다며 도둑에게 탈출을 제안한다. (“There must be some way out of here", “Businessmen, they drink my wine, Plowmen dig my earth”) 그러자 도둑은 침착한 말투로 (탈출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며 시간 또한 많이 지체되었으니 탈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No reason to get excited", “And this is not our fate”, “The hour is getting late”) 이어지는 3절에선 계속 감시탑에서 밖을 지켜보는 지배자와 두 명의 말 탄 자들이 등장한다. (“All along the watchtower princes kept the view”, “Two riders were approaching”)
이에 대해 기독교적 해석, 그에게 익숙한 묵시록적 해석도 등장했고 바빌론 멸망의 과정 자체를 풀어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 외에 시기적으로 가사가 베트남 전쟁의 내용을 암시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커는 국민, 도둑은 미국 정부로,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에게 그만둘 이유가 없다고 설득하는 정부와 감시탑에 올라가 베트남을 주시하는 프랑스라는 해석이지만 어느 것이든 정답일 순 없다. 밥 딜런이 기독교 신자임을 밝힌 <Slow Train Coming>의 행보를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적 풀이가 나름 합당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그것도 '일각에서는...'으로 끝나고 만다. (정연경)
![15.jpg]()
Lay lady lay (1969)
써 내려간 문장의 가치가 반짝였을 때 딜런은 세상을 뒤로하고 내면으로 파고든다. 오토바이 사고 후 회복을 위한 휴식이었지만, 저항운동 때문에 소란한 밖으로부터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는 전자 기타와 록 비트를 내려놓고 조용한 내슈빌에서 쉼을 택한다. 마음의 안정에서 나온 소박하고 여유로운 소리는 컨트리 록 앨범 <Nashville Skyline>으로 이어진다.
「Lay lady lay'는 아내 사라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곡이다. '침대에 몸을 뉘어 나의 곁에 머물러줘요.' 노랫말만큼 부드러운 저음의 보컬, 스틸 기타가 구애송을 젠틀하고 중후하게 꾸며놓는다. 이 시점의 딜런은 사회적 메시지를 넘어 보다 많은 이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영역으로 옮겨간다. 분석이 필요했던 가사는 공감을 지향했고 선율의 힘이 더해져 이 곡은 1969년 싱글 차트 7위에 안착한다. 태동의 시기 젊은이들이 듣기에는 점점 차분해졌지만, 컨트리 록의 새싹은 1970년대 무성히 자라 이글스, 잭슨 브라운 같은 대표 가수들에게 영향을 준다. (정유나)
![16.jpg]()
Knockin' on heaven's door (1973)
대중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은 밥 딜런 곡이다. “이게 밥 딜런 노래였어?”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이 노래의 제목과 멜로디는 대부분 기억한다. 어쩌면 이 곡은 밥 딜런의 명성과 구별된 자체적 지분 속에 팝 역사의 명곡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도. 빌보드 싱글 차트 12위까지 올랐고, 밥 딜런은 이 노래로 1973년 그래미상 최우수 남성 록 보컬 퍼포먼스 후보에 선정되었다. 에릭 클랩튼(레게 풍)과 건스 앤 로지스(하드록)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다채롭게 리메이크했지만 원곡의 처연한 감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건스 앤 로지스 버전은 미국 한 매체에서 역대 최악의 리메이크로 선정되기도 했다.)
곡이 시작되면 심플한 기타와 오르간, 그리고 노래 전반에 깔리는 허밍과 코러스 가운데 딜런의 무심한 보이스가 시작된다. 단 4개의 코드 속에 전개되는 단순한 멜로디, 반복된 가사, 2분 30초 남짓한 미니멀한 구성이지만 이 노래는 듣는 이의 귀와 가슴을 파고드는 멜랑콜릭한 신비로움이 있다. 가스펠적 느낌과 제목으로, 또한 이후 그의 종교적 회심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이 노래를 종교적 노래로 오해하기도 한다.
서부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Pat Garrett & Billy the Kid>의 주제곡이지만, 2절 가사에서 '어머니 이 총을 땅에 내려놓게 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아무도 쏠 수 없어요'에서 느껴지듯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해 죽어가는 군인의 심정을 노래한 대표적인 반전 가요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한 편으로는 당시 저물어가는 1960년대 히피 문화와 저항정신에 대한 씁쓸한 엘레지(elegy)로, 또는 밥 딜런 자신의 황폐해진 내면세계의 자화상으로도 느껴진다. (윤영훈)
![17.jpg]()
Tangled up in blue (1975)
밥 딜런은 말했다. “「Tangled up in blue」를 완성하는 데, 사는 것 10년, 곡 쓰는 데 2년 걸렸다.” 대게 좋은 곡은 힘들 때, 밝고 행복할 때보다 우울함을 가득 품고 심연의 늪을 헤엄칠 때 나온다. 이 곡이 그런 것처럼 또 그가 말했었던 것처럼 「Tangled up in blue」의 가사에서 느껴지는 생체기 난 마음은 고통의 시간과 비례했다.
사라 로운즈와의 결혼 생활이 그 끝에 다다랐을 때 밥 딜런은 「Tangled up in blue」의 첫 구절을 적었다. 앨범 명부터 심리적인 고통의 길을 걷고 있었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Blood on The Tracks>의 첫 트랙을 담당하고 있는 이 곡은 앨범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부분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마치 한 편의 콜라주처럼 시점들이 뒤얽혀 있는 가사는 항상 외로웠던 남자와 그를 떠난 한 여자의 스토리를 뒤죽박죽 붙여놨다.
이해하려고 두세 번 곱씹어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가사에 난감하다가도 당시 곡을 써 내려갔던 그의 심경을 가늠한다면 해석은 필요치 않다. 그저 아픔과 추억의 흐름을 따라 펜을 움직였을 테다.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직 길 위에 있다.' (박지현)
![18.jpg]()
Simple twist of fate (1975)
'피에 젖은 노래들'. 비록 그 자신은 부정했다지만, 노래가 수록된 앨범 <Blood on The Tracks>(1975)의 면면은 분명 자전적이다. 당시 부인 사라 로운즈와 불화를 겪고 있던 정서가 음반 곳곳에 배어있다. 그러나 이 곡만큼은 예외다. 노래에는 당초 '4th Street affair'라는 부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4번가는 바로 뉴욕 정착 초기에 사귀었던 연인 수즈 로톨로(Suze Rotolo)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가 있던 길. 수즈 로톨로는 <The Freewheelin' Bob Dylan>표지 속 딜런과 팔짱 낀 여인이다.
퍼즐을 맞추다 보면 언뜻 이들에 관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노래의 대부분은 한 남성에게 일어난 하룻밤의 '단순한 운명의 장난'을 제3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데 주력한다. 반전은 말미에 드러난다. 화자의 시점이 1인칭으로 바뀌자, 그는 잃어버린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반쪽이라 믿는다며 떠나간 연인을 그린다. 그리고는 결국 '단순한 운명의 장난'을 탓한다. 정황상 10여 년 전 연인이었던 수즈 로톨로를 모델로 한 것으로 의심되나, 이번에도 원작자는 적극 부인했다. 이렇듯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복잡한 연애사를 간직한 노래 속 명문(明文)은 단연 이것. '운명의 단순한 장난을 탓하는 수밖에'. (정민재)
![19.jpg]()
Idiot wind (1975)
앨범 제목 <Blood on The Tracks>처럼 당시 딜런의 상황은 가혹했다. 아내와의 이혼, 음악적으로도 잘 풀리지 않았던 시기. 음반에는 고통의 날이 서있다. 「Idiot wind」는 그때의 쓰라림을 담아내듯 수록곡 중 가장 목 놓아 부른다.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은 멍청이(Idiot)라는 단어에 담겼다. 마음속에 딱딱하게 응고된 상처와 외로움이 냉소적인 노랫말로 표현된다.
행복으로 가득 찬 결혼 앨범 <Blonde on Blonde>와 반대로 이별의 음반은 밟혀 부서진 가을 낙엽처럼 황량하다. 이 시기의 문구는 가장 힘들었던 삶의 바닥에서, 숨길 수 없는 애수 속에서 피어났다. 자기 고백적인 가사를 따라 음악 스타일 또한 초창기 어쿠스틱 포크로 되돌아간다. 대중은 록에서 포크음악으로 귀가한 밥 딜런을 열렬히 환영했다. 뛰어난 창작은 다양한 굴곡으로부터 발현되었고, 그를 다룬 전기 영화 <아임 낫 데어>에서는 밥 딜런 역에 6명의 배우가 등장해 각각의 순간을 연기한다. 거장의 삶을 다층적으로 다루어준, 명곡을 다시 듣는 기쁨이 담긴 영화였다. (정유나)
![20.jpg]()
Hurricane part I (1976)
미국의 프로 복서로서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 덕에 허리케인(Hurricane)이라는 별명으로 명성을 날리던 루빈 카터(Rubin Carter)는 1966년 뉴저지의 한 식당에서 백인 세 명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루빈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복역 중 자서전을 출간하는데, 이를 읽고 감명 받은 딜런은 교도소로 직접 찾아가 그를 면회하고 싱글 「Hurricane」을 발매하기에 이른다.
루빈이 겪어야만 했던 비극은 8분여간의 러닝타임을 통해 온전히 전개된다.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대사와 스토리텔링은 당시의 현장감을 그대로 전한다. 백인의 부당을 고발하는 딜런의 어투는 조소를 머금고 있다. 빠른 템포 아래 리듬감을 형성하는 어쿠스틱 기타와 스트링 사운드의 긴박함이 사건의 무게감을 밀도 높게 채운다. 기결(起結)에 자리 잡고 있는 절(節)은 이야기의 운율을 형성한다. '이것은 허리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래는 대중들에게 루빈의 사연을 알리는데 일조하였고, 1985년 산고 끝에 그는 누명을 벗고 석방된다. 이 곡은 후에 그의 사연을 다룬 영화 <허리케인 카터>의 OST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실질적인 현실의 사태를 음악으로 녹여내어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되었음에 단순한 예술 이상의 투쟁가(鬪爭歌)로써 가치를 형성한다. 순수 노랫말이 만들어내는 메시지의 시적 표현력 또한 문학적인 의미 생성의 주요 원천으로 작용한다. (현민형)
![21.jpg]()
One more cup of coffee (1976)
1976년에 발표한 앨범 <Desire>에 수록한 곡으로 국내에서는 선망과 핫의 대상인 커피가 들어간 덕에 줄기차게 전파를 타면서 애청되었다. 라디오 프로에선 커피 사연을 받으면 어김없이 선곡했다. 딴 곡 다 제치고 이러한 멜로딕하고 처연한 노래만이 우리 팝팬들의 편애를 받나 싶었지만 밥 딜런의 자아를 영화화한 <아임 낫 데어>에 '뜻밖에' 이 노래가 깔리면서 괜히 다행이다,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다. '걔네들도 이 곡을 좋아하는구나!'
노랫말은 역시 풀이가 쉽지 않다. 집시 방랑자 집안의 소녀와 '아래 계곡'으로 떠나는 자의 얘기인데 그 관계는 버림, 관계의 종말인 동시에 재(再) 도래 등등 온기와 습기의 은유들로 엉켜있다. 매력적인 부분은 역시 하모니를 이루는 여성 보컬로 주인공은 당대 '여성 컨트리 록의 다크호스'였던 에밀루 해리스(Emmylou Harris)다. 남녀가 호흡을 맞췄다는 것도 국내 팬들의 꾸준한 청취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많은 남자들이 흠모하는 여성에게 커피와 이 곡을 묶어 애정을 실어 날랐다. '내가 저 아래 계곡으로 길 떠나기 전에 커피 한 잔 더 부탁해요!' (임진모)
![22.jpg]()
Changing of the guards (1978)
'명색이 대학생인데 매달리면 해석을 왜 못하겠어? 아무리 밥 딜런이라지만 그래봤자 팝송 아냐?' 어렵사리 가사를 구했다. '근데 이게 뭐지?' '하지만 에덴은 불타고/ 그러니 마음 다잡고 제거하든가/ 아니면 경비를 바꿀 용기를 가져야 할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안 되다 보니 자위가 필요했다. 나중 들었지만 존 레논도 '밥 딜런은 언제나 가사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살짝 투덜거렸다는데 나야 당연한 거 아닌가.
서구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누군가는 16년간의 음악 여정, 결혼, 종교성 등에 대한 심도의 묘사라고 누군가는 묵시록적 견해라고 했다. 딜런 자신도 “부를 때마다 의미가 달라진다. 「Changing of the guards」는 천년 묵은 노래다!”라고 했다 한다. 사정이 이런데 오래 붙잡고 있다고 해결이 되겠는가. 결론. “포기하자. 노랫말 의미 파악을. 모른다고 음악의 감동이 줄어드는가. 이럴 때는 포기가 상책이다!”
히트곡 모음집에 실리지 않다가 1994년 발매한 세 번째 히트곡집(Greatest Hits Volume 3)에 수록되었을 때 정말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뭔지 모른 채 (1978년 나왔으니) 40년 가까이 듣고 있는 의리와 수절을. 그리고 곡은 잘 고른 것 아니냐는 걸, 가끔 들러 자리에 앉으면 잠시 후 무조건 이 곡을 매번 그리고 10년간 틀어주시는 홍대 롤링홀 근처의 카페 '별이 빛나는 밤에'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올린다. (임진모)
![23.jpg]()
Gotta serve somebody (1979)
“이상적인 방향으로 문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수여해라”라는 유언에 따라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밥 딜런이 선정되었다. '음악인 최초 노벨문학상', '포크 록의 전설'이라는 다양한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밥 딜런의 이번 수상에 대중들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그는 시적인 가사 외에 새로운 장르를 빗어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수상에 의미를 더한다.
포크록을 창시했던 것처럼 「Gotta serve somebody」를 통해 CCM의 기원을 만들었다. 1970년대 후반 기독교에 빠지며 눈에 띄게 짙어진 밥 딜런의 신앙심은 <Slow Train Coming>, <Saved>, <Shot of Love>등 여러 앨범을 낳았고 그중 CCM의 시초가 된 이 곡은 교회에서 불리는 종교적 의식이 가득한 가스펠에 대중음악적 요소를 접목해 탄생했다.
'신인지 악마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누군가를 섬겨야만 해.'
기독교에 심취해 있던 당시 그는 가사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써 내려갔다. 어떤 사회적 위치나 상황에 있든지 주를 받들고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밥 딜런은 아이러니하게도 포크록으로 청년들을 저항의 띠로 엮었던 것과는 반대로 가스펠을 대중이라는 영역에 옮겨 놓으며 크리스천들을 신앙의 힘으로 단합하게 했다. 그렇게 그는 기독교에 전도자 적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박지현)
![24.jpg]()
Not dark yet (1997)
밥 딜런은 딱히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던 80년대를 지나 90년대 중반까지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한다. <Under The Red Sky> 이후 7년간 그저 과거의 작품들을 연주하며 시간을 보내는 그에게 새로움이란 없었고 밥 딜런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대중의 머릿속에서 잊히는 듯했다. 그러나 1997년 딜런은 <Oh Mercy>의 다니엘 라노이스(Daniel Lanois)와 다시 한 번 팀을 꾸려<Time Out of Mind>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당시 그의 나이는 56세. 몸 상태도 악화되었던 딜런은 결코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의 수작을 탄생시켰다. 음반은 <Blood on The Tracks>의 독백적, 성찰적 메시지와 신앙 또는 신화를 컨트리 블루스에 녹여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대중은 노장의 돌아온 음악적 감각에 환호했고 앨범은 차트 10위라는 상업적 성공과 그래미 수상의 영예를 모두 거머쥐게 된다.
「Not dark yet」은 앨범 내에서 가장 차분한 곡이다. 화자는 죽음을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사색한다. 해가 지고 있지만 잠이 오지 않고, 시간은 흘러만 간다. 자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 (“It's too hot to sleep and time is running away”, “Feel like my soul has turned into steel”) 남아있는 인간미는 아름다움을 뒤로 한 채 희미해지고 (“My sense of humanity has gone down the drain”, “Behind every beautiful thing there's been some kind of pain”)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거짓으로 가득 찬 세계의 끝에 도달했다. (“I've been down on the bottom of a world full of lies”)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은 다가온다. (“I was born here, and I'll die here against my will”) 감각이 점점 흐려지고 죽음이 다가온다. (“Every nerve in my body is so vacant and numb”, “Don't even hear a murmur of a prayer”)
딜런은 죽음을 둘러싼 생각을 의식의 흐름과 감각 작용을 통한 묘사로 서술했고, 그가 존 키츠의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노래(Ode to a Nightingale)'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한다. 시의 1절 1구와 3구를 살펴보면 '내 가슴은 저리고, 졸리는 듯한 마비가 내 감각에 고통을 주는구나.', '혹은 어떤 감각을 둔하게 하는 아편의 찌꺼기까지 들이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흐릿해지는 감각과 그 묘사를 빌려왔다는 것이다.
노래는 딜런이 생사의 고비를 겪기 전 완성되었지만 가사는 흡사 죽음의 순간을 예견한 모양새다. 혹은 항상 죽음을 가까이하고 있던 것은 아닐지. 순례자가 행진하는 분위기와 단순한 리듬은 성스러운 감정마저 촉발한다. 해는 저물고 그림자는 드리워진다. 그러나 아직 어둡지 않다. 온몸의 신경이 숨을 죽여가지만, 그래도 아직 어둡지 않다. 죽음의 순간에 역설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절망의 끝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아직 어둡지 않다'. (정연경)
![25.jpg]()
Make you feel my love (1997)
'비바람이 그대 얼굴을 적시고 온 세상이 당신을 버겁게 할 때,
내가 그대를 따뜻하게 안아줄게요. 당신이 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거장의 창작력은 1990년대에도 빛났다. 사회 참여적, 자기 성찰적 가사뿐 아니라 로맨틱한 글짓기에도 능했던 그는 지천명이 지난 나이에 세기의 러브 송을 남겼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언제고 무엇이든 하겠단 달콤한 고백은 아름다운 선율에 실려 힘을 발휘했다. 비록 젊은 시절의 미성은 간데없이 까끌까끌한 목소리였지만, 또 다른 매력을 느끼기엔 충분했다.
사실 노래는 빌리 조엘의 세 번째 베스트앨범<Greatest Hits Volume III>를 통해 세상에 첫 선을 보였다. 간발의 차이로 밥 딜런 오리지널 버전이 그의 30번째 정규 앨범 <Time Out of Mind>에 실려 공개됐고, 곧이어 노래의 진가를 알아본 후배들에 의해 커버가 이어졌다. 특히 요즘 청취자들은 이 노래를 아델의 버전으로 기억한다. 그는 데뷔 앨범 <19>(2008)에서 곡을 취입했는데, 해당 음반에서 스스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도 밝힌 바 있다. 뛰어난 이야기꾼이자 멜로디 메이커인 딜런의 내공이 유감없이 발휘된 명곡. (정민재)
![26.jpg]()
Things have changed (2006)
특유의 파동이 큰 스네어 드럼으로 곡이 시작되고, 마이너 스케일의 가라앉은 공기 안에서 딜런은 대화하듯 가사를 읊는다. 여기서 그의 보컬은 거칠면서도 은근히 세련되었다. 타코 버전의 「Putting on the ritz」를 듣는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무심하게. 영화감독 커티스 핸슨의 팬심(?)으로 성사된 작업에서 딜런은 기존의 곡을 삽입하는 대신 영화 <원더 보이즈>만을 위한 새 노래를 작곡했다. 이 곡으로 딜런은 2001년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두 곳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그의 노래가 영화에서 흘러나온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포레스트 검프>(1994)에서는 1966년 <Blonde on Blonde>앨범에 수록된 「Rainy day women #12 & 35」가 삽입되었고, 좀 더 늦게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2001년 작 <로얄 테넌바움>, 여기엔 딜런의<Self Portrait>(1970) 앨범에 수록된 「wigwam」이 있다.
우리는 종종 현재진행형의 전설을 체험한다. 데뷔 직후부터 음악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된 밥 딜런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식지 않은 창작열을 보여주었다. 발전하는 클래식 아이콘. (홍은솔)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